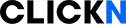디지털산업정책보고서
정책용역보고서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관리자
- 2024-03-15
- 조회: 373
과제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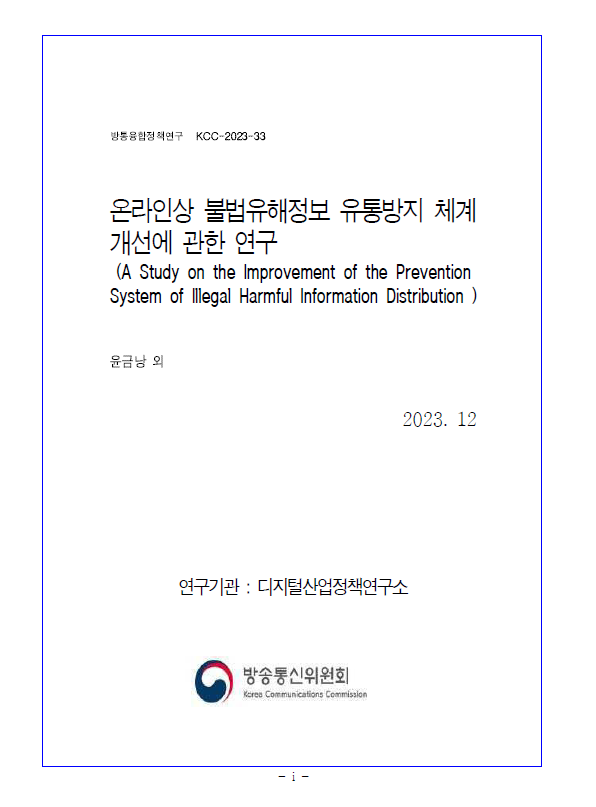
|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
| 방송통신위원회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 02-2110-1538 | 2023-10-01 ~ 2023-12-31 |
| 방송통신융합 | |
| o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접근차단을 통한 이용자 보호 o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가 다양화되고 급증함에 따라 유형별 삭제·접속차단 방법을 차별화·효율화할 필요성 제기 |
- EU, 영국, 호주 등은 자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국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자국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불법유해정보의 관리책무가 소홀해짐을 방지하고자,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영국과 호주의 온라인안전법 제정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해외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규범 및 규제 마련 논의가 추진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불법정보의 대상을 명확히 범주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심의절차와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유해정보로 판별된다면 해당 정보는 접속제한이 되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다. 온라인 상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의 범위는 점차 다양해지고, 그 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인해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유해정보의 심의 대상의 절대양은 점차 증가하고, 심의 속도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량의 정보가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정보통신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접속제한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피해가 가중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불법.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심의 체계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이러한 불법.유해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업자 스스로가 규범을 정하여 규제하는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플랫폼에 대한 유통방지 책무 강화 기조를 바탕으로 국내 자율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표현의 자유와 구성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온라인환경의 이념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가 규범과 규제를 통해 관철하고자 하는 가치를 실행하는 방안으로써 자율규제 혹은 규제된 자율규제 등의 대안적인 규제체계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다양한 참여자들이 존재하며, 일방적인 규제 혹인 일방적인 자율규제 만으로는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균형점 잡힌 규제방식의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